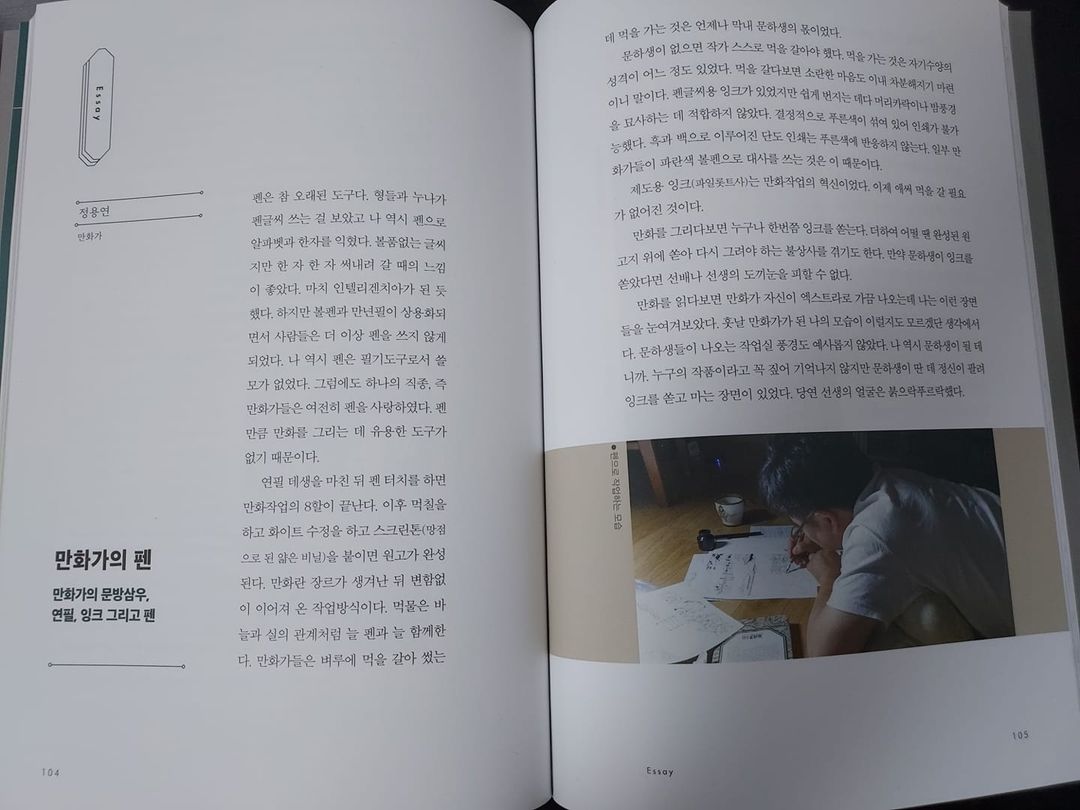
펜은 참 오래된 도구다.
형들과 누나가 펜글씨 쓰는 걸 보았고 나 역시 펜으로 알파벳과 한자를 익혔다.
볼품없는 글씨지만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의 느낌이 좋았다.
마치 인텔리겐차가 된듯했다.
하지만 볼펜과 만년필이 상용화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펜을 쓰지 않게 되었다.
나 역시 펜은 필기도구로서 쓸모가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의 직종, 즉 만화가들은 여전히 펜을 사랑하였다.
펜만큼 만화를 그리는데 유용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연필 데생을 마친 뒤 펜텃치를 하면 만화작업의 8할이 끝난다.
이후 먹칠을 하고 화이트 수정을 하고 스크린톤(망점으로
된 얇은 비닐)을 붙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만화란 장르가 생겨난 뒤 변함없이 이어져온 작업방식이다.
먹물은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늘 펜과 늘 함께 한다.
만화가들은 벼루에 먹을 갈아 썼는데 먹을 가는 것은 언제나 막내 문하생 몫이었다.
문하생이 없으면 작가 스스로 먹을 갈아야했다.
먹을 가는 것은 자기 수양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었다.
먹을 갈다보면 소란한 마음도 이내 차분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펜글씨용 잉크가 있었지만 쉽게 번지는데다 머리카락이나 밤풍경을 묘사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푸른색이 섞여 있어 인쇄가 불가능했다.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단도 인쇄는 푸른색에 반응하지 않는다.
일부 만화가들이 파란색 볼펜으로 대사를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도용 잉크(파일롯트사)는 만화작업의 혁신이었다.
이제 애써 먹을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만화를 그리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잉크를 쏟는다.
더하여 어떨 땐 완성된 원고지 위에 쏟아 다시 그려야 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만약 문하생이 잉크를 쏟았다면 선배나 선생의 도끼눈을 피할 수 없다.
만화를 읽다보면 만화가 자신이 엑스트라로 가끔 나오는데 나는 이런 장면들을 눈여겨보았다.
훗날 만화가가 된 나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르겠단 생각에서다.
문하생들이 나오는 작업실 풍경도 예사롭지 않았다.
나 역시 문하생이 될테니까.
누구의 작품이라고 꼭 짚어 기억나지 않지만 문하생이 딴 데 정신이 팔려 잉크를
쏟고 마는 장면이 있었다.
당연 선생의 얼굴은 울그락 불그락이다.
세상은 늘 변화한다.
베틀을 짜던 아낙네가 방직기가 등장하자 일순 손을 놓았고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력거꾼들이 손님을 빼앗겼듯 만화가들 역시
컴퓨터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더구나 컴퓨터로 그리는 만화라니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초기 컴퓨터 작업은 마무리 작업에 머물렀다.
마우스를 이용해 스크린톤 효과를 내거나 난이도가 높지않은 채색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압력감지가 되는 타블렛이 나와 펜터치도 가능해졌다.
컴퓨터 기술은 하루게 다르게 진화했다.
액정화면인 신티크의 등장으로 콘티는 물론 뎃생, 펜터치,
채색작업까지 풀로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대중의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었듯 이같은 기술의
진화로 만화가들의 작업방식 또한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독자와의 소통방식도 바뀌었다.
잡지 단행본 신문 등의 종이매체가 아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통해 만화를 소비하게 되었다.
이름조차 바뀌어 어린 세대들은 만화보다 웹툰이란 용어가 더 친숙하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웹툰을 보고 있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페이지를 넘기는 대신 스크롤을 내린다.
출판만화 잡지시장의 몰락과 함께 대안으로 탄생한 웹툰은 더 이상 변방의
예술장르가 아니다.
인기 웹툰은 수억만 뷰를 기록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진출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져 파급력은 나같은 변두리 작가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는 원소스 멀티 유즈의
성공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직업 1순위가 웹툰 작가임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주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모두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달려가는 호랑이 등위에 올라타지는 못할지라도
호랑이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겠다며 눈을 부라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와 혁신을 말하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소리를 높인다.
나또한 묵은 껍질을 깨고 변화하고 싶다.
좀 더 빨리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게으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에 둔감하다.
만화작업 역시 마찬가지다.
만화가들이 사랑해 마지않던 도구 펜!
컴퓨터가 펜을 대신 할 수 있게 되자 급기야 펜촉을 만들던 곳이 하나 둘 문을 닫았다.
지금은 일본에서 한 사람의 늙은 장인만이 펜촉을 만들고 있다 한다.
장인이 죽으면 펜촉은 생활사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소비하는 이가 적으니 값도 올랐다.
600원에 살 수 있던 것을 이제 1,600원에 사야만 한다.
제도용 잉크를 만들던 파일로트도 생산을 멈추었다.
덕분에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만화가들은 질 낮은 수입제품을
사다 쓰거나 먹을 갈아 써야만 한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서예용 먹물이었다.
그냥 쓰면 번지므로 먹을 갈아 쓰는데 너무 진하면 선이 잘 나가지 않고 조금 묽다 싶으면
터치 도중 먹물이 툭하고 떨어진다.
펜을 길들이는 만큼 먹물의 점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펜은 참 다루기 힘든 도구다.
삼십년 세월을 펜과 함께 해왔지만 여전히 원하는 방향으로 선이 나가지 않는다.
특히 여자 얼굴을 그릴 때 참 어렵다.
손 끝에 힘을 조금 더하고 덜하지 않고의 차이로 후덕한 얼굴이 되기도 하고 강팍한 인상의
얼굴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두께가 일정한 로트링 펜을 쓸 수는 없다.
펜촉처럼 탄성을 이용한 두께조절이 로트링 펜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남들이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을 그을 때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을 긋고 있는 자신이 특별해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써온 도구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이 펜이다.
펜이란 말의 어원은 깃털을 뜻하는 라틴어 penna라고 한다.
구한말에는 철필촉(鐵筆?)이라고 했다.
권총을 뜻하는 육혈포와 같이 참 옛스러운 말이다.
내가 죽어 한국 만화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만화사를 쓰다보면 부득불 나란 사람에 대해 한 마디 써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말을 빼놓지 않고 써주길 부탁한다.
'정용연
21세기. 철필촉을 사용해 원고를 제작한 만화가.
펜선을 그을 때마다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를 좋아했다. '
만화 비평지 "지금만화" 12호에 쓴 에세이.



